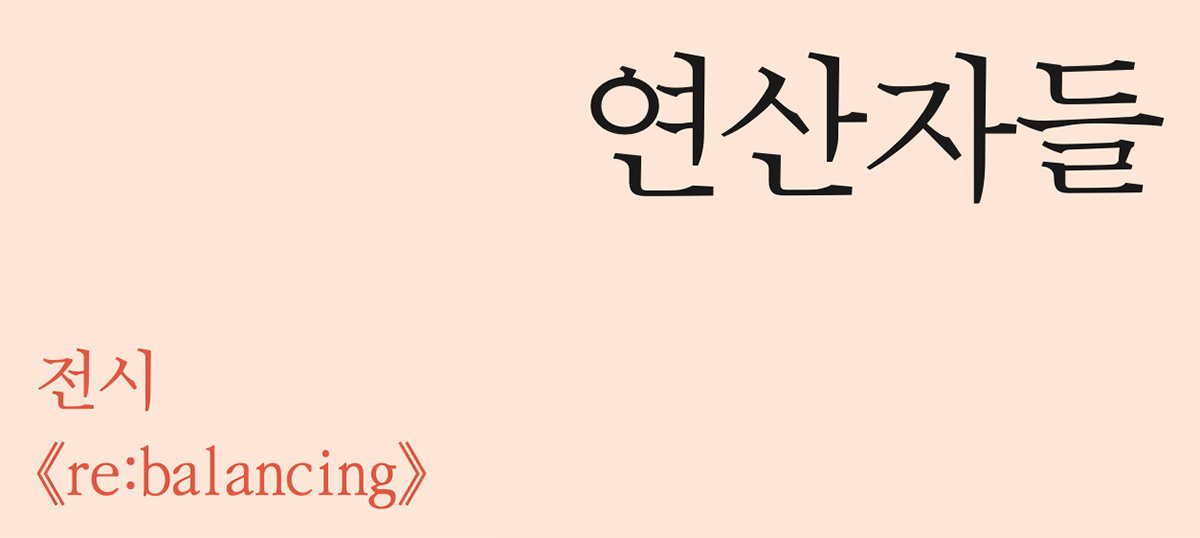

ⓒ Whistle, Studio Bilder
갤러리 휘슬(Whistle)에서 강동호와 이주경의 2인전 《re:balancing》(4.2~5.8)이 열렸다. 서문에서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의 “균형이 무너진 오늘날” 우리가 “각자 자신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재조합해(rebalancing)” 현재의 변화를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명시적인 목적은 관객을 작가와 공통된 지평으로 초대하기 위한 친숙한 문턱 같은 것이다. 오히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작업이 호응하거나 충돌하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 보는 수학 연습장처럼 보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관객이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건 이주경의 사진과 강동호의 회화가 번갈아 가며 가지런히 걸려 있는 모습이다.1 왼쪽으로 돌아서면 까만 색면 또는 컵 안에 든 내용물이 (마찬가지로 컵 또는 캔버스의) 귀퉁이를 힘껏 밀어내고 있는 난감할 정도로 큰 강동호의 〈Two Cups〉(2021)가 보인다.2 그리고 그 너머로 환하게 밝혀진 바닥이 시커먼 어둠을 짜부라뜨려서 그 틈으로 강아지가 튀어나오는 이주경의 사진 〈Dog in mountain〉(2019)이 걸려 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내부에 운동성이 잠재된 정지해 있는 것들을 마주치는 경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에게 익숙한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술래의 기분을 떠올릴 수 있다.
단정한 질서와 느닷없는 출현의 엇박자는 전시를 보는 내내 계속된다. 가령 강동호의 〈Rotisserie〉(2017)와 이주경의 〈Cat tail〉(2019)은 전시 초입에 불가피하게 열려 있는 갤러리 사무실에 (마치 위장된 것처럼) 숨겨져 있어서, 이미 지나친 뒤에 다시 보아야 하거나 또는 부러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중간중간 정돈된 배치로 두 작가가 병치되는 경우와 〈Two Cups〉처럼 전시의 흐름을 끊어내는 작업이 맞물려 안정적인 흐름과 그 흐름의 깨짐이 반복되는 경험을 만들어 준다. 이 경험은 사진기를 들고 서울을 배회하던 이주경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영화관, 스마트폰, 그리고 밤 산책에서 강동호가 이미지를 마주치는 경험이기도 할 것이다.

ⓒ Whistle, Studio Bilder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분명 전시장 뒤편에 마련된 작은 복도에 있다. 복도의 한 구석에는 아크릴로 그려져 질감보다 색과 형상이 두드러지는 강동호의 〈Red Folk〉(2020)와 앞서 산발적으로 등장했던 사진들을 갈무리해 주는 이주경의 사진 세 점이 있다. 여기서 어떤 감각 또는 예감(결국 이 둘은 같은 말이다)이 마련된다. 갑자기 번뜩이는 안광을 내면서 어둠 속에서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복도 끝에서 이어폰이 순간 멈춘다(〈Twin Peaks〉 (2021)).3
여기서 순전히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강동호의 작업에서 운동성을 만들기 위해 화면 안에 색면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Red Folk〉에서 화면에 긴장을 고르게 분배하는 흰색 원반 위의 곡선 등. 아니면 이주경의 사진이 일상적 풍경들 사이에 선과 색면 등의 조형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두 작가가 일상 또는 일상적 사물을 다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이야기를 해 보자.
갑자기 눈앞에 얼룩이 지듯 시야가 휘청거릴 때가 있다. 일상을 위태롭게 하지도, 커다란 심경의 변화를 주지도 않지만 그 순간은 분명 지속되는 일상에 선명하게 표시되는 흠집, 주름이다. 눈앞의 사람이 윤곽 지어진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서 보이는 일,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들 사이에 분명한 실체로서 자리한 공간을 보는 일 등. 그 순간은 기존에 알던 것을 그저 재확인한 것이기에 사건이 되기에는 싱거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 마치 눈앞에 문지방이 있었던 것처럼 대뜸 들어오는 일 혹은 하나의 사물 또는 사람이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 나타나는 경험. 그때 하나의 순간은 주름을 만들며 과거로 접혀 들어간다.

강동호, Twin Peaks, 2021, Acrylic on canvas, 80.3x130.3cm
한편으로 강동호의 아크릴 회화는 사물의 형상에 이 주름을 보충할 형식적 수단을 고민한 결과이다. 〈Twin Peaks〉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연출된 상투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 사진을 정확히 그린 것이다. 그러나 강동호는 정확히 그리기 위해 두 색면으로 화면을 분할하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선이 보라색 팁이 달린 이어폰의 두 꼭대기에 정지된 것으로서 운동감을 보충해 준다. 우리가 “Twin Peaks”를 발음할 때 fix가 불가피하게 그 발음 속에서 지나가듯이, 강동호가 드러내는 건 형상의 고정점(fixed point), 사물을 대면할 때 마주치는 모든 의미가 지워진 0도의 지점, 즉 실제성의 지나감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경의 사진은 일상 안에 추상이 들어오는 순간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Cat tail〉의 경우 꼬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 〈burn toast〉의 경우 토스트를 위에서 붙잡고 있는 색면이 그런 추상들이다.4 이 추상은 일상 속에서 경험의 조건이며, 사적인 정서가 머무는 하나의 장소이다. 이주경은 사람의 시야와 가장 유사한 화각을 가진 표준렌즈를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화각이 아니라 눈과 카메라의 기계적 유사성이다. 광학장치가 식별하지 못하는 건 인간의 눈도 식별하지 못하며, 그렇게 사진 안에 식별되지 않고 경험되기만 할 뿐인 추상이 기록된다. 현상된 사진을 통해서 경험은 시각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운반된다.

이주경, Untitled (Burnt toast). Seoul, 2018., 2021, Gelatin silver print, 40.2x32.3cm
이런 점에서 강동호와 이주경의 작업들은 미리 전제된 내용을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매체가 아니라 덧셈, 뺄셈처럼 수식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연산자(operator)이다. 전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강동호가 “일상적인 사물이 흉기 등 예상하지 못한 용도로 탈바꿈하는 연출” 또는 사물의 의미가 변함으로써 사물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순간에 주목하고, 이주경이 “즉각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주변의 흔적”을 포착하듯이, 두 작가의 작업은 앞서 말한 일상의 주름 또는 어떤 지나감을 생산한다. 이때 우리는 그 지나간 것을 생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생성을 이미지라 부른다.
전시의 마지막 작품(〈Grown up〉(2017))에 이르러 지나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면, 전시장 입구에 걸려 있던 것과 다른 버전의 〈Seoul Forest〉(2017)를 발견하게 된다(첫 번째 사진 맨 오른쪽 작업). 이 작업은 창틀에 잘 가려져 있다. 여기에는 초록색 풀들의 흐름을 오히려 되살려 주는 검은색 다리가 앞선 작업보다 화면 위쪽에 묻어 있다. 이 작업은 앞선 작업과의 닮음 때문에 또는 그 두 작업이 닮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 말도 안 되지만 작업에도 책임이 없지 않은 어떤 예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 예감은 전시장에 멈춰 있는 수많은 연산자들 가운데로 유령 같은 무언가의 지나감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동호와 이주영의 이번 전시는 관객을 멈춰 세우면서 비어 있는 전시장 한가운데, 또는 우리의 일상에 움직임을 보충해 준다. 다시 새롭게 균형을 맞추듯이.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