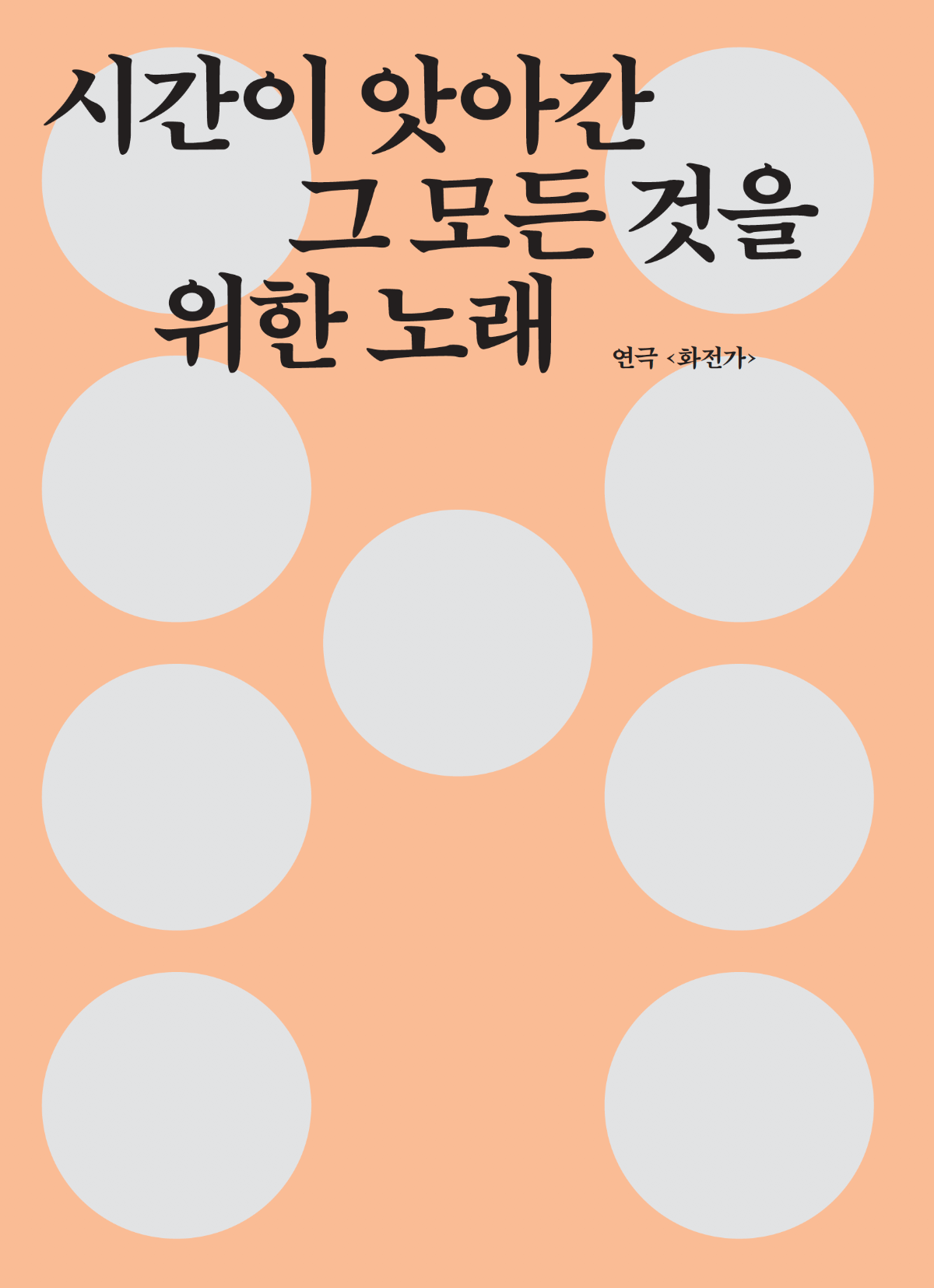
인간은 언제 노래를 부를까. 송 모먼트(Song Moment). 뮤지컬에서 등장인물이 더 이상 대사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때, 넘버가 시작되는 순간을 말한다. 연극 ‹화전가›가 코로나19로 인해 본래 예정보다 5개월 가량 늦게 관객들을 만났다. 화전가는 고단한 생을 견디다 찾아온 봄날 단 하루 꽃놀이에서 부르는 ‘가사’, 즉 노래다. 남성 화자가 남긴 것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이 여성 화자 것으로 음식 만드는 법과 그 맛, 사는 이야기처럼 시시콜콜한 수다와 감정을 담고 있다. 연극 ‹화전가›에서 등장인물들은 종종 노래를 부른다. 그 지점들은 뮤지컬의 송 모먼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엄마의 환갑연을 축하하기 위해 각지로 흩어져 살던 딸들 희야, 정아, 봉아가 모인다. 그중 유독 막내 봉아를 아끼는 고모, 저마다 사정으로 남편이 없는 시가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둘, 그 집에서 살림을 맡아 하는 독골할매와 그가 걷어 키운 홍다리댁까지 무대 위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여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단일화하기 힘든 다양한 성격을 지녔다. 각자 이고 있는 하늘과 딛고 선 땅이 다르기에 이야기가 출발하고 갈등이 시작된다. 엄마는 잔치 대신 곱게 차려입고 화전놀이를 가자고 제안한다. 큰딸 희야도 들어보기만 했던, 잊혀가는 풍습이다. 정작 무대에서 화전놀이 풍경을 볼 수는 없다. 그 전날 밤, 둘째 딸 정아가 가져온 커피와 초콜릿을 나눠 먹다가 어느덧 판이 커진다. 이웃이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안하다고’ 가져온 소주에 고기를 구워 곁들이며 시끌벅적하게 화전놀이 전야제를 시작한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뱉으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전까지 짧은 대사, 얕은 한숨, 이내 거두고 마는 시선 등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드러난 인물들의 이야기와 꾹 눌러만 두었던 묵은 감정이 이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등장인물들은 술에 취해서야, 꽃들이 제 빛깔을 하늘 위로 올려 보내는 밤이 되어서야 터져 나오는 감정들을 뱉고, 노래한다. 독골할매와 고모가 아리랑을 이어 부를 때, 변소에 간 봉아의 무서움을 달래는 홍다리댁의 구성진 노래 한 자락이 희야와 고모의 처절한 울음 위로 덮일 때. 관객들은 인물들이 굳이 구구절절 말로 뱉지 않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극의 배경은 1950년 4월 안동이다. 그리하여 등장인물들은 고어가 섞인 안동 사투리로 발화한다. 들려오는 낯선 언어 탓에 혹여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배삼식 작가가 고르고 골랐을 말들을 쉬이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도입부분을 지켜봤다. 대사가 많은 공연이라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들도 낯선 안동 사투리로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했을 터다. 그러나 아주 약간의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나면, 부풀리거나 왜곡하지 않은 일상의 수다 같은 노래가 잔잔히 들려온다. 방언 지도를 맡은 안동 토박이 이원장 선생조차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세심히 구현된 옛 안동 사투리는 극의 시공간을 강조한다. 배삼식은 언제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작가다. 그 시절, 그 공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충분히 공감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특정 시공간에 녹여낸다. 이번 ‹화전가› 역시 그러했고, 섬세하게 그려낸 안동지방 구어는 알 수 없는 향수를 자극하는 데에 톡톡한 몫을 했다. 소리가 옹골지고 동글동글하게 들려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다. 그 노래가 객석에 스민다. 모든 대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순 없어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선과 문맥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전달된다.

©국립극단
이러한 언어 위로 정교하게 세팅된 음향효과와 시각효과가 극에 사실성을 더하고 감정을 증폭시킨다. 일상 이야기를 담은 무대는 상징적이다. 다소 휑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무대에 무게감을 더하는 것은 직선적인 이미지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대범한 사선으로 불에 타버린 절을 표현하고, 높은 극장 층고를 무시하듯 등장인물들의 머리 위를 내리누르는 굵직한 대들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좌파 집안 여인들의 녹록하지 않은 삶의 무게를 시각화한다. 시대의 커다란 흐름 속에 견뎌내야만 했던 개인의 비극, 그럼에도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나지막이 눌러앉는 대화가 어느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율적으로 계산된 시각효과 덕분일 것이다. 이어 무대에 내리는 비는 무대에 수직적 이미지를 더한다. 무대 뒤편부터 점차 차오르는 물은 애틋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드리운 불안을 상징한다. 은은하게 퍼지는 종소리는 애달픈 그리움을 일깨우고,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먹먹한 시선과 만나 관객의 마음마저 허하게 만들어버린다. 이어 포탄소리가 들려온다. 극은 모두가 알고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그려내지 않아도 관객들은 다시는 오늘 같은 날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무정한 시간이 밤의 재 흩뿌리며 / 그대의 한낮을 어둡게 물들일 때 / 시간이 앗아간 그 모든 것을 / 나 여기 다시 새기네, 그대를 위하여.”1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봉아가 소네트를 읊는다. 앞서간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산다. 정들 새도 없이 먼저 떠난 남편은 원망조차 사치로 만든다. 어린 시절 멋모르는 실수는 낫지 않는 생채기가 된다. 올곧은 성정은 쉽게 드러나는 불행이자 알아차리기 힘든 희망이다. 데려다 키운 딸은 자꾸만 인생의 급류에 휘말린다. 그 누구 하나 쉬운 생이 없어서,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서 박힌다.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시대, 그리고 역사. 그 커다란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시를 읊고, 웃을 수밖에 없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채로. 어떤 때는 어깨를 내어주고 어떤 때는 어깨에 기대며,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끝이 있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그 아름다움에 눈물이 맺히던 무대, ‹화전가›였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