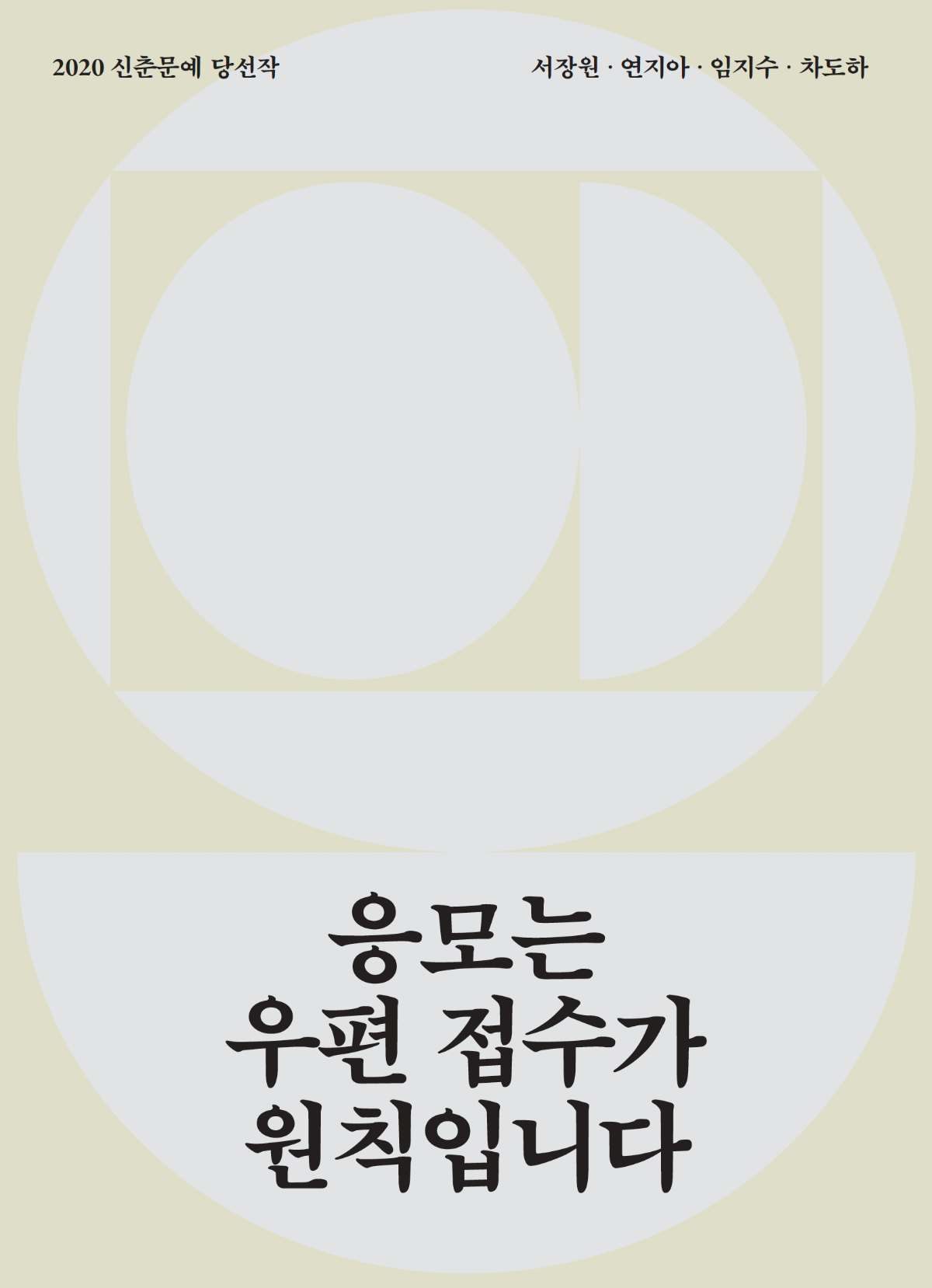
그는 등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동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던 사람이라 학부 조교실 책상에는 독서대와 A4용지, 시집과 소설책이 무질서한 정갈함을 갖춘 채 놓여있었다. 그는 폰트와 여백이 깔끔하게 정리된 소설 한 편을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근로 장학생이었던 나는 그와 함께 다른 업무를 겸해 석관동 우체국에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지 않는 제도에 대해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군말 없이 몇 군데의 출판사에 보낼 봉투를 등기로 접수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올해 신춘문예에 당선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작가 네 명도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 옮겨 다녔던 장소를 지나 우체국을 향하던 그들의 걸음엔 어떤 생각이 묻어있었을까. 당선 작품집으로 두 작품, 인터넷으로 두 작품을 읽었다.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인터넷 공간엔 그들이 세심하게 제출한 종이의 흔적은 사라져있었다. 당선작이 거주할 좋은 공간이 사라지는 상황이 작품의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네 작품 중 하나엔 으레 집이 등장할 줄 알았던 나의 기대는 빗나갔다. 모두 어딘가를 방문하거나 떠돌고 있었다. 서장원의 단편소설 ‹해가 지기 전에›의 중심 공간은 자가용과 카페지만 등장인물의 최종 목적지는 정신병원이다. 그곳은 주인공 기선의 아들이 입원해있는 곳이지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의사였던 아들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말한다. 연지아의 희곡 ‹마지막 헹굼 시 유연제를 사용할 것›(이하 ‹마지막…›)의 코인세탁소는 희지와 윤선이 관계를 맺는 장소이면서 불청객처럼 들락거리는 가게 주인이 있는 장소이다. 임지수의 희곡 ‹저 나무 하나›의 공간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와 주변 나무들이 벌목되는 군락지이며, 차도하의 시 ‹침착하게 사랑하기›에서 신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은 어둠이 내려앉는 강변이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은 인물들의 예민하고 불안한 낯빛을 드러낸다. ‹해가 지기 전에›에서 기선은 아들이 과거를 기억해주길 바라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아들의 차를 가지고 나온다. ‹마지막…›에서 윤선과 희지는 서로 도우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지만 세탁소 주인의 무례함으로 끝내 불편한 분위기를 지울 수 없다. ‹저 나무 하나›에서 벌목 하청업체 팀장인 수길은 자신의 아들 종찬이 탐탁치 않고 회사에서 나온 종찬과 비슷한 나이대의 희영이 귀찮다. ‹침착하게 사랑하기›에서 나는 특별한 사랑을 약속하지 않는 신을 원망한다.
불안정한 공간에서 상황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해가 지기 전에›에서 기선은 아들과 자신의 행복이 동일하지 않은 정신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 ‹마지막…›에서 윤선은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쏟았던 딸이 결혼 뒤에 무심해지자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팔고, 아픈 어머니의 곁을 병간호하기 위해 이사를 준비한다. ‹침착하게 사랑하기›에서 그들이 걷던 강변의 해가 지고 있다. 어둠이 내려앉고, 연인들이, 사랑이 떠나가고 있다. 신은 “연인들의 걸음이 멀어지자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린다.” ‹저 나무 하나›에서 해가 지기 전 일을 끝내야 하지만, 용달차가 오지 않고 있다. 서로가 가진 기대가 무너지고, 숨겨져 있던 상흔이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 정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헤매는 인물은 도시에서 떠도는 우리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작가들은 인물이 한 공간에서 헤매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감정을 살펴본다. 면회를 거절한 아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해변에서 기선은 일몰에 벌어지는 불꽃놀이를 목격한다(‹해가 지기 전에›). 밝은 하늘에 흩뿌려지는 ‘빛의 부스러기’를 보며 느낀 기선의 감정은 허무함이었을까. ‹저 나무 하나›에서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서로의 상처만을 알고 난 뒤 어긋나는 시선들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침착하게 사랑하기›에서 나는 맞은 뒤 신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까. ‹마지막…›에서 희지와 윤선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고양이를 공유하며 서로의 삶에 희망을 나누려한다. 하지만 따뜻한 온기 속에 남겨진 그늘은 윤선이 희지의 번호를 간직한 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실패한다. 어쩌면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1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를 구하지 못했던 오르페우스 신화가 떠올랐다. 오르페우스의 절망 뒤에 남겨진 에우리디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르페우스 신화엔 에우리디케를 삶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오르페우스의 입장만 담겨있다. 이제 현대는 에우리디케의 감춰왔던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해가 지기 전에›의 아들은 ‘천진한 행복감’을 얻은 곳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인물이다. ‹마지막…›에서 희지는 여러 번 신춘문예에 낙방했지만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힘을 가진 인물이며, ‹저 나무 하나›에서 종찬과 희영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탐색하며 가감 없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침착하게 사랑하기›에서 '나'는 신에 대한 의문과 화를 참지 않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어둠으로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 그들은 누군가와 결속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독을 긍정한다. 그래서 고독의 공간에서 자신의 말을 멈추지 않는 것은 글쓰기의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모리스 블랑쇼의 말과 연결된다. 그들의 공간은 문학의 공간과 닮아있다.
문학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블랑쇼는 자신의 저서인 ‹문학의 공간›에서 문학을 정의하면서 생기는 구분과 위계를 경계한다. 어쩌면 신춘문예를 정의해왔던 과거의 규정과 전통들에 이제 질문을 던져야 문학의 공간을 지금의 작가에게 맞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신춘문예는 신인 작가를 등용하기 위해 작품을 우편으로 지원받고 일회성 상금으로 끝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블랑쇼가 글쓰기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문학의 공간을 꿈꾸듯, 작가가 글쓰기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문득,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 작가를 꿈꾸는 조와 동생 에이미의 대사가 떠올랐다. 언제나 곁에서 글을 쓰고 있을, 당신에게 붙이는 나의 편지이기도 하다.
조
Who will be interested in a story of domestic struggles and joys? It doesn’t have any real importance.
누가 내 고통이나 기쁨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겠어?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에이미
Maybe we don’t see those things as important because people don’t write about them.
글이 쓰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걸지도 모르지.
조
No, writing doesn’t confer importance, it reflects it.
아니, 글쓰기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는 거야.
에이미
I’m not sure. Perhaps writing will make them more important.
난 잘 모르겠어. 글을 쓰는 일이 그걸 중요하게 만들 지도 몰라.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