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예술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는 의도로, 비전문적인 관객이 읽을 수 있는 공상 과학 스릴러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석 대신 스릴러물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신경 쓰기나 할까?”1
우리는 자주 글을 통해 미술을 독해하려고 시도한다. 대부분의 전시장에서 설명문 혹은 비평문은 벽면이나 종이에 출력되어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연하고 지당한 일일까? 미술의 해석을 공상 과학 소설로 대체한다는 상상을 실현한 전시 «가능한 최선의 세계»(2019.12.10.-2020.5.3,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소설가 정지돈이 구축한 ‘블루프린트’와 ‘레드프린트’라는 두 개의 세계관을 통한 미술 관람 방식을 제시한다. 소설 속 설정에 따르면 블루프린트는 알고리듬에 의해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세계이며, 레드프린트는 그 반대항인 예측불가능한 세계다. 관객은 전시장 입구에서 먼저 소설의 서문을 읽고 세계관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 관람 동선과 소설을 읽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순간부터 문학과 미술이라는 두 예술언어의 관계는 문제적인 것이 된다. 상반된 두 세계관의 관계처럼 전시에서 작동하는 문학과 미술의 관계 또한 ‘협업’과 ‘어긋남’이라는 두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먼저 블루프린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전시는 문학과 미술의 유사성 및 협업 가능성을 극대화한 결과다. 예술 작업이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면 문학의 스토리텔링과 미술의 시각적 제시 방식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두 개의 언어인 셈이다. 관객은 일정한 시간 동안 전시를 관람한 후 전시장에서 수집한 소설 텍스트들을 엮어 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술 감상의 기억은 문학 읽기로 보완되고 확장된다. 그러나 문학과 미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가정을 하는 순간 일종의 위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문학이 담당하고 있어 소설 중심으로 체계가 형성되며, 미술이 전달하려 했던 것은 문학의 일부로 수렴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다중우주로 설정된 레드프린트의 세계는 우주여행과 시간이동이 가능하며 어긋남이 도처에 있는 세계다. 어긋남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 전시의 관람 경험은 소설가의 오해를 등에 업고 미술 작업을 보는 ‘이중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시 서문과는 달리, 전시장의 곳곳에 배치된 소설은 미술 작업을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미묘한 연계성을 갖는) 맥락으로 편입시켜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린다. 예를 들어 정지돈의 필터에 의해 이은새의 ‹돌 던지는 사람›과 ‹밤의 괴물들› 시리즈 일부는 우주 종말 직전의 세계를 보는 가이드 투어의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다. 다른 전시에서의 맥락2을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고개를 갸웃하겠지만 이내 다시 끄덕이게 된다. 밤은 우주와 닮았으며, 누군가 종말의 광경을 관람하려 한다면 가이드의 대담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텍스트를 통한 관람이 미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관람자의 인식을 환기시켜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다. 두 개의 예술 언어가 이중으로 보내 온 메시지를 오독(誤讀)하는 재미야말로 이 전시 관람의 즐거움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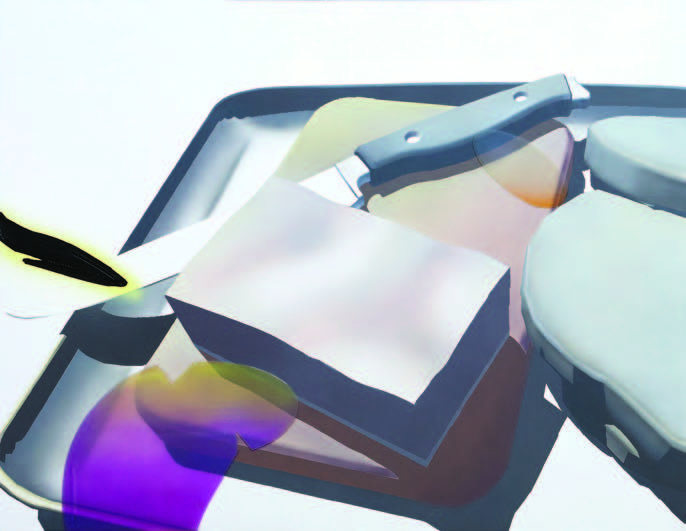
정희민, ‹빵과 칼›, 디지털, 2018
2.
“만일 누군가가 절대 불변의 행성에 살고 있다면, 그가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인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 생각해 봤자 별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세상 역시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3
이제 소설에서 제시하는 두 개의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장 단순하게는 블루프린트(예측가능성)는 필연, 레드프린트(예측불가능성)는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법칙을 절대적 필연 또는 우연이라는 극단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런 세계관은 결국 무의미로 이어질 것이다. 정지돈의 소설은 두 세계의 극단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틈새의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브녜(vny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전시 역시 두 개의 ‘숨겨진 공간’을 포함한다.
블루프린트의 숨겨진 공간인 옥상에서는 유영진 작가가 작업을 위해 수집한 이미지와 스케치 등 제작 이전 단계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의 소우주와 같은 이 공간에서는 작업의 청사진 자체가 완성된 작업과는 별개로 확장된다. 한편 레드프린트의 숨겨진 공간에서 상영되는 김희천의 ‹메셔›는 오프라인 세계의 실체가 온라인의 데이터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와 오류를 탐색한다. 이 시차와 오류 사이에서 ‘나의 그래픽이 나를 대체한다면 나는 쓸모없을까?’, ‘마침내 알고리듬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차조차 사라진다면, 그것을 편리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AR과 VR은 이미 우리의 세계를 다중우주로 만들기 시작한 것 같다. (데이터로 쌓아올린 예측가능성의 세계인) 온라인 공간이 (물리적 변수의 세계인) 오프라인과 교차할 때 두 세계는 조화롭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은새,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아이스크림›, 캔버스, 2014
이처럼 숨겨진 공간들은 블루프린트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어긋남의 단서가 된다. 레드프린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블루프린트 또한 다중우주의 일부이며, 레드프린트의 혼돈은 결국 블루프린트의 알고리듬에 대한 비평적 탐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동시대의 예술 또한 완벽하게 파악 가능한 빅데이터의 일부가 아닌, 알고리듬의 틈을 찾아 오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적 존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만이 예술의 향유자가 된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