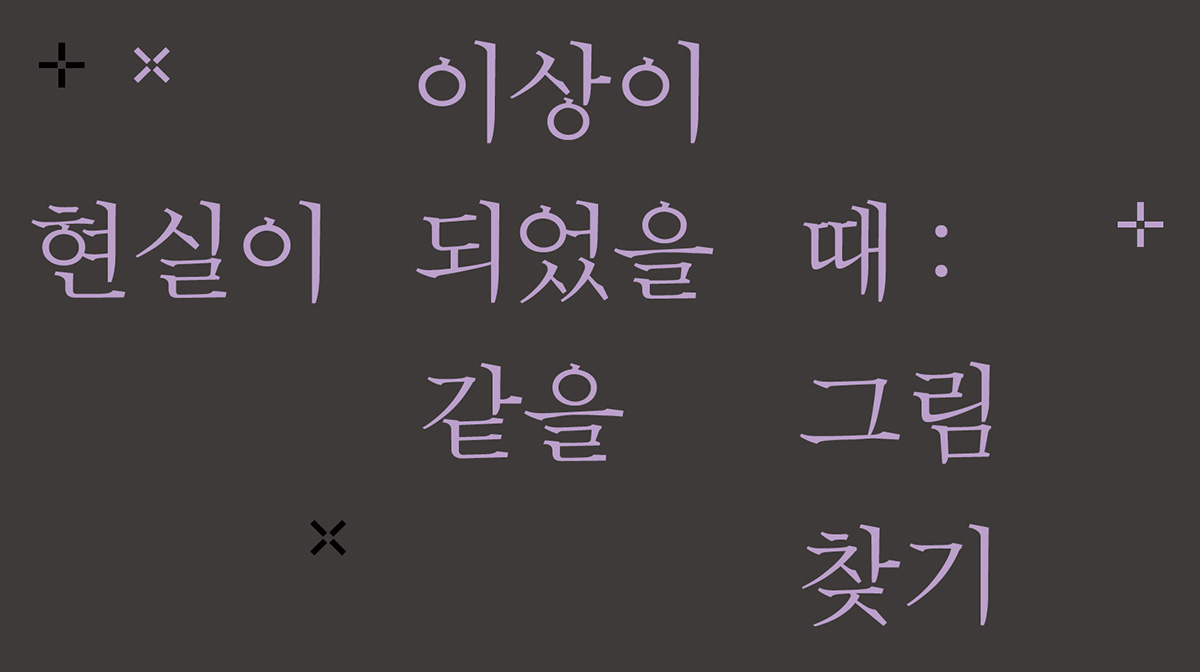
‘이상’은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이상’은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異常),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理想),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以上) 등 다양한 사전적 정의를 갖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균형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인 관성의 영향으로 균형을 벗어난 상태에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선 움직임이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 그 움직임은 곧 사유와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 세 수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 수업들은 이야기의 활발한 오고 감을 통해 불안정한 지반 위 균형을 만들어 냈다.
이상(異常)에서 발견한 것들
미술원 미술이론과의 전공 수업인 <전시기획연습>, <박물관학> ,<뮤지엄 운영과 교육>은 모두 미술이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현장에 관해 다루는 수업이다. 팬데믹 상황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세 수업의 커리큘럼에 생겨났다.
<전시기획연습> 수업에서는 온라인 환경에 관련한 여러 담론을 다루며, 특히나 정보의 양적 증가에 따라, 정보를 잘 경험하고 감각하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 줌(zoom)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사용하여 외부 미술계 인사의 특강을 1~2차례 진행해 외부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물관학>의 경우 기존의 수업에서는 뮤지엄의 역사, 소장품, 관객, 공공성 등 뮤지엄이라는 공간을 다각도에서 통시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여기에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비물질 환경에서 펼쳐질 때, 이에 따라 작품과 공간 인식 방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뮤지엄 운영과 교육>에서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탐구해 보는 시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부터 생겨난 수업상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 수업의 중심축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점이 인상 깊다. <전시기획연습>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전시’라는 실천이 가진 의미에 집중했고, <박물관학> 수업은 뮤지엄을 움직이는 가장 기저에 있는 목적을 탐구해 갔으며 <뮤지엄 운영과 교육> 수업에서는 기관 내부자의 시선으로 뮤지엄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사고해 나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온라인이라는 환경 자체에 곧바로 다가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시와 뮤지엄 본래의 가치를 잘 학습하고, 그 이후에 외부와의 여러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코로나로 인해 개통된 ‘비대면’이라는 경로를 사유하는 일은 뿌리를 향해 가는 또 하나의 다른 길이었을뿐 뿌리 자체의 위치가 변화했음을 전제하는 일은 아니었다.
현장을 대면하기
이들 수업은 현장을 다루는 수업답게 팬데믹 이전에도, 이후에도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현장 학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그치는 일이 아니다. <전시기획연습>을 담당하는 현시원 교수는 현장 학습의 목적을 현장 학습의 계획에서부터 상정한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고, 현장에서의 시간을 보낸 이후 이를 소화해 내는 것 까지의 과정을 모두 잘 거쳐가는것 모두가 곧 현장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인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현장 체험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전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여러 곳의 소규모 갤러리를 관람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규모가 크고, 한 번의 방문을 통해 기관, 관객, 공간 등 모든것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방문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연재 교수의 <박물관학>과 <뮤지엄 운영과 교육> 수업에서 현장 체험 학습은 타임 캡슐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작금의 관점에서 작품과 기관을 방문하고 이것을 기억 저편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의 관람에서는 이전의 기억을 켜켜이 쌓아 올려 작품에 더 깊은 외연을 만들어 보는 일이 그것이었다. <박물관학>과 <뮤지엄 운영과 교육> 수업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현장 체험이 이러한 맥락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팬데믹 시대 현장의 기억은 미래에 우리의 색다른 비교군이 되어 깊은 사유를 제공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의미한 체험이었다.
코로나 이후의 혹은 코로나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겪은 일상의 무수한 변화들은 미래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디스토피아적 상상으로 몰아갔다. 매스컴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명제가 묵시록적 뉘앙스를 띤 채 돌아다녔고,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변화된, 그리고 변화될 지점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미래라는 그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현재와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와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을 것, 즉 ‘현재와 여전히 같을 그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팬데믹 상황 안에서 예술의 현장을 배우는 과정은 본래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사고하는 과정이었다. 폭풍에 가까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뿌리를 더욱 섬세하고 충격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로써 이상(異常) 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사유하게 한 이상(理想)은 변화에 발맞춘 새로움이 아닌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클래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1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