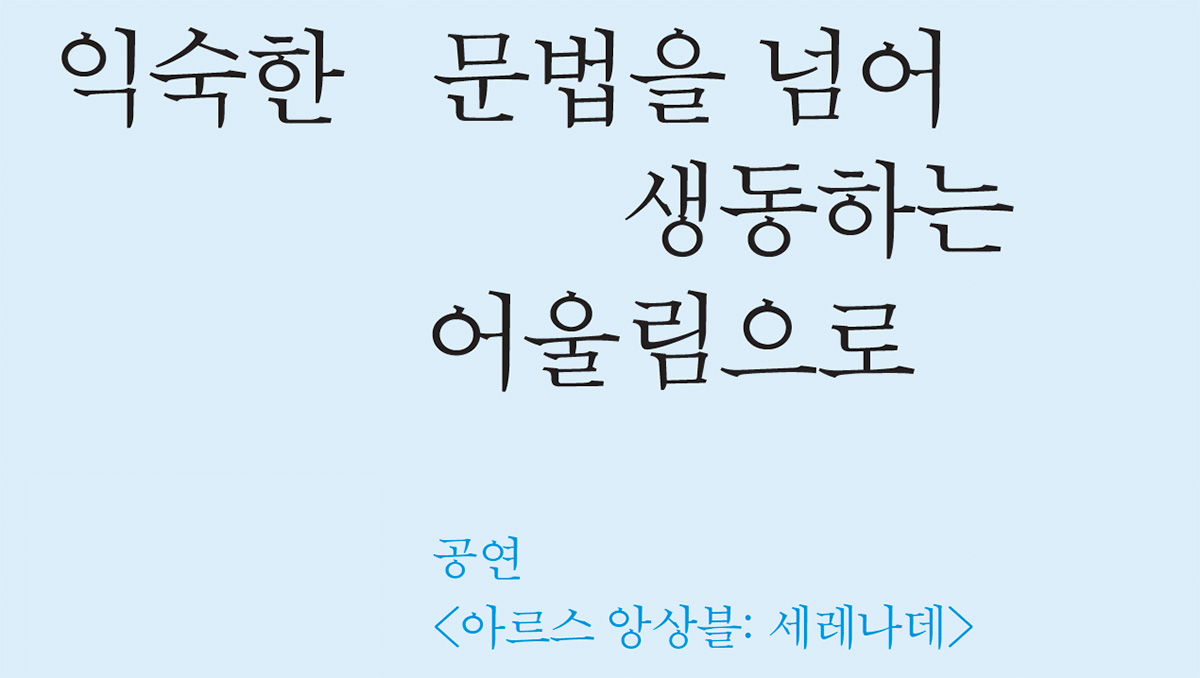
어느 때보다도 여럿이 호흡을 맞추기 어려운 시절, ‘앙상블’은 왠지 낯설게 다가오는 단어이다. 우리에게 앙상블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뿐이 아니다. 한국에서 작은 규모의 앙상블은 독주자 혹은 대형 오케스트라보다 관심을 덜 받는 편이다. 이는 과거 서양음악이 한국에 처음 유입된 시기, 그들의 연주 기술을 따라잡느라 기교가 돋보이는 독주를 우선했던 분위기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악기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호흡이 중요한 현악사중주 등 실내악을 연주하는 전문 단체가 풍성한 지원을 받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실내악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향악에서 연주와 감상의 즐거움을 점차 발견해 왔다.

민간 연주단체의 꾸준한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연주자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단체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서울바로크합주단(1965년 창단)을 시작으로 한국페스티벌앙상블(1986년 창단) 등 몇몇 단체가 실내악 영역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덕분에 오늘날 한국에도 적지 않은 수의 앙상블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도 창단 이후 따를 만한 모델이 없어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한 앙상블의 활동이 한국에서 유지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인지 한예종 동문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창단된 아르스 앙상블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소식은 기분 좋은 떨림을 준다.
아르스 앙상블은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 전문사에 재학 중인 양자열을 주축으로 모인 한예종 동문들이 2020년 창단한 예술단체로 지금까지 세 번의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첫 번째 연주회(김동현 협연)는 ‘조화’를 테마로 김성기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랑>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베토벤 교향곡 4번을 나란히 선보였고, 올해 봄 두 번째 연주회(김대진 협연)는 모차르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열린 세 번째 정기연주회(채재일 협연)에서는 ‘세레나데’라는 부제를 달고 고전과 낭만에 걸친 세 작품을 연주했다.

© 마스트미디어
대체로 빠른 작품이 등장했던 1부에서는 그들의 조직력이 빛났다. 템포가 빠르거나 치밀한 조직력이 요구되는 작품의 경우 종종 지휘자의 역할이 비대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지휘자의 리드 아래 앙상블 혹은 오케스트라가 마치 하나의 잘 설계된 기계 혹은 공장처럼 돌아가면서 여백이나 여유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르스 앙상블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선사했다. 첫 곡이었던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나장조 K. 136>는 경쾌한 분위기와 더불어 청중들의 마음을 열기에 아주 적절한 설득력을 갖추어 귀를 즐겁게 했다. 연주자들은 조급하지 않은 실내악을 구사하며 하나의 음악을 정교하게 쌓아갔다. 베버의 대표적인 실내악 작품 중 하나인 <클라리넷 5중주 Op. 34> 에서도 앙상블은 협연자의 기교적 선율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뒷받침해 주었다. 클라리넷의 익살스러운 매력을 돋보이게 한 1악장과 능글맞게 주도권을 주고받은 3악장에서 앙상블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2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 48>에서는 보다 느린 템포로 감정적 역동을 표현해야 하는 도입부와 코다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빠르게 재잘거리는 부분들과 충분한 대비가 나타날 만큼 전환의 순간을 확실히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실수 없이 잘 굴러가는 소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깊은 감정의 주파수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농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였다. 더불어 연주 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고전과 낭만에 머물러 있는 레퍼토리였다. ‘고전 클래식 음악부터 현대 창작 음악까지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예술 단체’라는 앙상블의 소개 문구에 걸맞은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를 조금 더 보고 싶었다면 욕심일까. 현재까지 그들이 선보인 협연과 레퍼토리는 믿고 들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음악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악 단체인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전 서울바로크합주단)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20여 년이 걸린 것처럼 어떤 앙상블도 처음부터 완성형의 연주와 철학을 갖추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들의 연주가 지닌 아쉬움보다도 이제 막 태어난 앙상블의 유연성과 생기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궁금해진다. 물론 지속해서 활동하는 앙상블의 존재 자체가 귀하지만, 젊은 연주자들이 모인 만큼 실험과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익숙한 클래식 공연의 문법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르스 앙상블만의 고유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기획과 연주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