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나는 환경 감수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 것 같다. 생수병 대신 필터형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휴대하고 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은 지속하려 노력한다. 얼마 전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키우던 화분이 조금씩 늘어나 10개가 됐다. 몬스테라, 칼라데아, 립살리스, 이자벨라 페페 등 요즘 플랜테리어(planterior)용으로 인기 있는 식물들이다.
그런데 나의 식물 키우기에 대한 관심은 더 큰 기류 안에서 생겨난 것 같다. 흥미롭게도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식물에 대한 열광은 더 눈에 띈다. 뉴스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식집사’ 혹은 ‘식덕’들이 자주 사용하는 ‘풀멍’ 등의 신조어를 소개하고, 게릴라 가드닝을 컨셉으로 한 웹 예능 <오늘도 삽질>과 같은 콘텐츠도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기반으로 미술, 패션, 상업 등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직업군이 출현하고1, 식물원을 컨셉으로 한 ‘자연친화형 미래 백화점’ 더현대서울(The Hyundai Seoul)이 개관하고2, 정원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의 전시 《정원만들기》(2021)가 인기를 얻는3 등 사회·문화 전반에서 사람들은 그리너리에 열광한다. 최근 몇 년간 미술계에서 동물권, 비인간, 환경보호 등 생태를 다루는 관련 전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전시는 인류학적이고 문화사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지금까지의 업보를 반성하고 인류세를 살아가는 대안적인 방식을 고민한다. 미술에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중반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현재 시점에서 유행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 이들 전시의 의미를 되묻고 싶었다. 이러한 회의적인 소회는 전시의 경험을 그린 하비(green hobby)에 대한 사회적인 열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1 ©분더샵, 플랜트소사이어티1

2 ©더현대서울

3 최정화, <너 없는 나도, 나 없는 너도>, «정원만들기» ©피크닉
전시의 역사: 17세기의 셈페르 아우구스투스에서 21세기의 필로덴드론속까지
최근 그리너리에 대한 관심은 매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형태의 변화II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그린 하비 부문은 매출액 상위를 차지한다. 비료, 종자와 화원·화초 업종, 홈 가드닝의 매출이 그 어느 때보다 상승했다.
그중 열대 관엽식물 안스리움속(Anthurium), 필로덴드론속(Philodendron)4은 삽수 하나에 시세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대표적인 ‘식테크’ 수단이다. 이들은 엽록소 결핍으로 무늬가 생긴 변이종으로, 희소성을 갖는다. 이들 희귀 식물의 값은 몇 년간 5~10배 이상 올랐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해 정부의 열대 관엽식물 수입 제한 조치가 있으나, 투기에 가까워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거슬러 가서도 확인된다. 셈페르 아우구스투스(Semper Augustus)라는 튤립 종5은 18세기 네덜란드에서 그 희소성으로 당시 집 한 채 가격인 1200 플로린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식집사들의 희귀 식물에 대한 열광은 이러한 현상과 닮았다. 이는 자연과 전시가 맺는 관계의 오랜 역사를 다시 불러낸다.
19세기 중반 벨기에나 영국의 식물 관련 사업자 혹은 컬렉터가 난초 사냥꾼을보내 남미, 아시아의 이국적인 난을 유럽으로 들여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남화연의 영상 작업 〈유령 난초(Ghost Orchid)〉(2015)6가 그리듯 동물원,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까지 이어지는 전시의 역사는 인간의 수집욕을 드러내 보인다. 자연사박물관의 기원이 되는, 7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호기심의 방(cabinets of curiosity)’7은 수집가의 취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각종 진귀한 소장품을 전시했다. 호기심의 방에서의 동식물과 광물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난 자연이다.

4 필로덴드론 핑크 프린세스

5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6 남화연, <유령 난초(Ghost Orchid)>, 2015 ©남화연
자연과 미술: 21세기 중반 이후 그 새로운 관계
동물원, 박물관과 그 맥을 잇는 전시의 역사로부터 미술관의 그것이 언제나 동일한 종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술가들이 외적인 요소를 작품에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대지미술, 환경미술, 어스아트라 불리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었다. 1980년대에는 환경운동의 흐름과 함께 미술이 사회 참여적 성격을 띠는 행동주의적인 형태로 변모했고, 1990년대 초부터는 각종 전시에서 ‘생태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파울 크루첸(Paul Crutzen)의 제안으로 기후변화와 지구 시스템의 파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묻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되면서 오늘날의 미술가들은 ‘인류가 만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유 안에서 미술의 형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의 미래를 그린다.
인류세 시대의 생태미술
그린 하비에 대한 관심과 소비만큼이나 생태를 이슈로 하는 전시가 근래 국내외로 많이 개최되었다. 인류세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 전시는 대개 환경 파괴의 문제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생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실천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2018년의 타이베이 비엔날레는 ‘생태계로서 미술관’을 주제로 열렸고,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은 2013년부터 시작한 ‘인류세 프로젝트(Anthropocene Project)’로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미술 형식으로 해결책을 탐구해 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뚜렷하게 목격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반려견과 함께 전시 관람이 가능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2020)을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연결성을 강조했고, 일민미술관의 《인류세 한국 x 브라질 2019-2021》8은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된 인류세 담론으로부터 지역 기반의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 구축을 시도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2021)9는 인천 지역의 생태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 공공과 보편의 문제로 확장을 꾀했다.

7 17세기 전형적인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iosity)’ 이미지를 보여 주는 1655년 코펜하겐의 보름박물관(Museum Wormianum) 카탈로그 판화

8 «인류세 한국 x 브라질 2019-2021» ©일민미술관, 브라질 상파울루 비데오브라질

9
그런데 생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전시들을 관람한 후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다. 이들 전시 또한 탄소 배출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가 종료되고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들만이 아니라 동물의 털로 제작되는 붓, 벌레로부터 추출되는 안료 등 작품의 재료는 전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소재로 하는 설치, 뉴미디어 아트 또한 디지털 쓰레기, 다크 데이터의 문제도 있다.
전시라는 행위는 생명의 본질을 강조하기에 효과적이지만, 자연을 기존의 맥락에서 분리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분리는 제국주의 시대 정복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다른 맥락으로 옮겨 오는 분리에서 그치지 않고, 전시 만들기의 전 과정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요소들이 형성하는 또 다른 분리가 발생한다. 동시대 미술관 또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공간으로서, 자연과 맺어 왔던 관계의 오랜 역사의 궤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것일까?
반쪽짜리 자연: ‘플랜테리어’와 ‘생태미술’을 넘어서기
미국 프린스턴대학 미술관은 《Nature’s Nation: American Art and Environment》(2018) 전시의 일환으로 ‘Ecology of an Exhibition’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는 앞선 전시의 작품 제작, 포장, 운송, 설치, 철거에 이르는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작품의 포장과 운송에 발생하는 에너지, 전시 디자인, 인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이슈를 분석했다10.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2021)11 또한 종이 리플렛을 사용하지 않고, 전시 가벽과 페인트를 재사용하는 등 전시 개최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환경적인 요소를 줄이려 했다. 부산현대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12은 품질을 희생하고서라도 폐기물, 홍보 인쇄물의 제작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제로 웨이스트를 시도한다.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미술관이 환경에 대한 폭력과 파괴의 대가로 유지되어 왔음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들은 환경적 유해함을 중심에 두고 예술을 분석하고, 발전 가능한 모델을 그려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Ecology of an Exhibition’ 프로젝트 ©프린스턴 대학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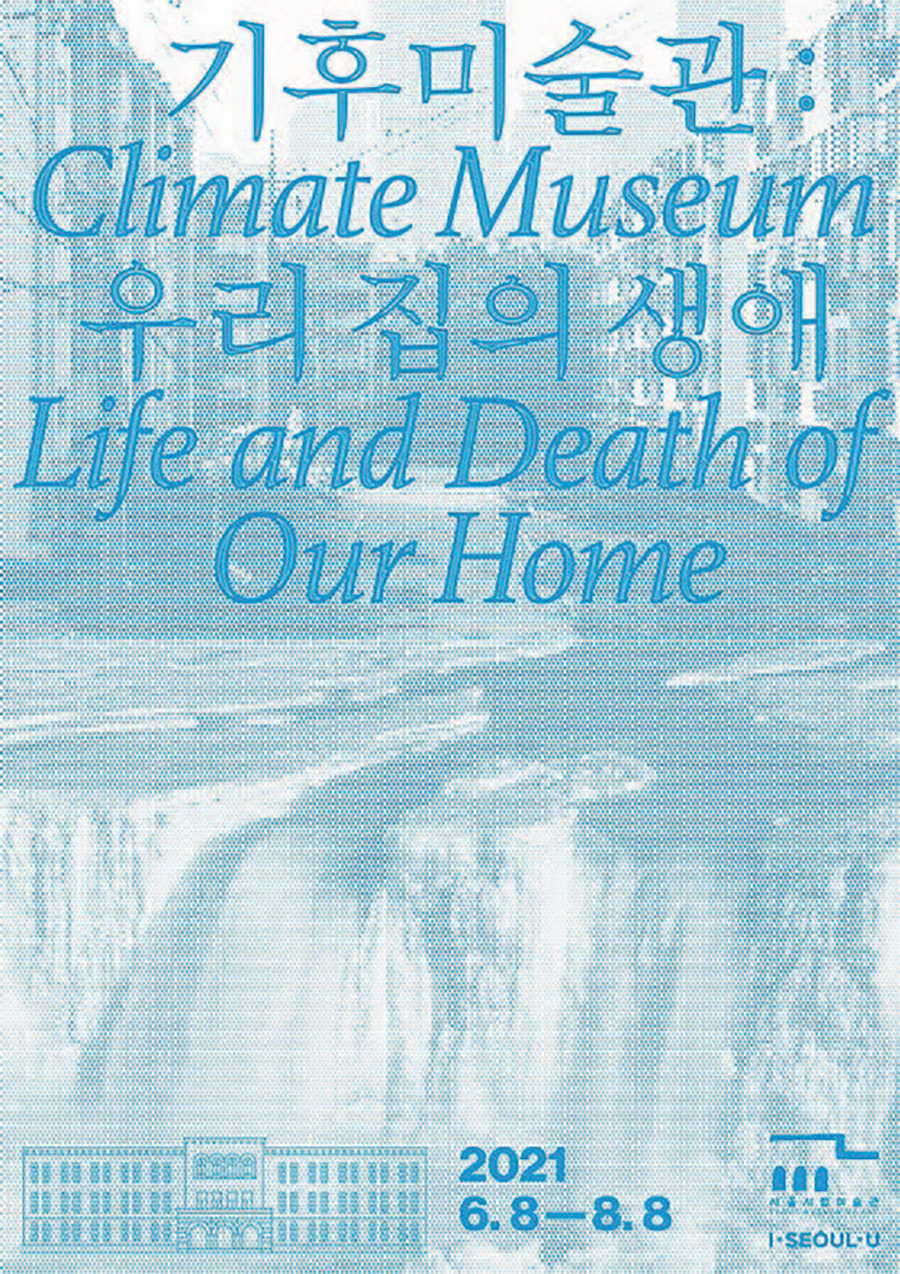
11

12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 ©부산현대미술관
식물 키우기에 대한 열풍은 자연-전시가 맺어 온 관계의 역사를 호명하고, 생태미술의 반환경적 실천은 호명된 이들과 조응하면서 전시 공간으로서 미술관이 갖는 한계를 소환한다. 이에 더해 인류보다 ‘자본’을 생태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된 인류세의 또 다른 이름 ‘자본세’의 의미 안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자본과 자연의 합작품이라면, 투기의 대상이 된 희귀 식물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보호되어 왔기에 가능했던 미술관의 자원 집약적인 전시가 그리는 생태는 반쪽짜리 자연의 모습으로 서로 닮아 있다.
미술이 생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반쪽짜리 자연을 전시하지 않기 위해 작품 제작과 전시의 지속 가능한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상처에 가져다 붙이는 밴드가 아닌, 코로나 이후 정상화될 미술관 운영에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그려 볼 수는 없을까. 전시 만들기에 있어서 도구로서 환경과 생태가 아닌,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말하는 ‘인간, 생물, 비생물들이 협력자가 되는, 모두가 지구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꿔 본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