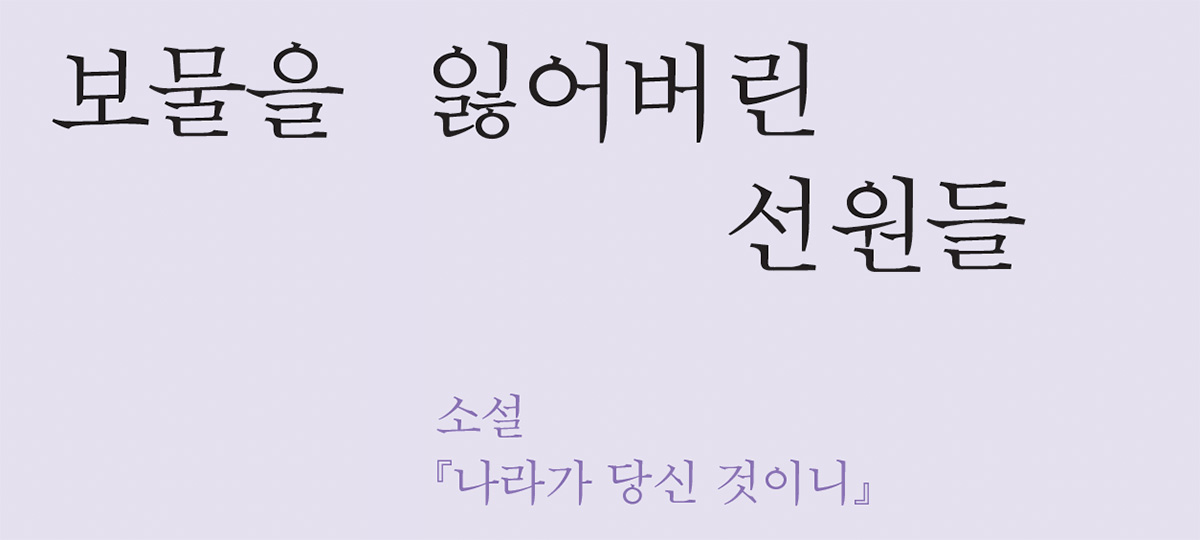
첩보 소설의 뼈대는 대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적이 있다.” 흑과 백, 명과 암의 세계의 어느 한 편에 놓인 인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첩보 소설의 문법인 것이다. 이편과 저편에 있는 세계가 충돌할 때, 그 물리적 갈등 내에 위치하고 심리적 문제를 지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첩보 소설의 주제다.
소설가 김경욱의 『나라가 당신 것이니』의 문법은 어떠한가. 코드 네임 라이카, 진짜 이름은 김도식, 또 다른 이름은 김감독. 우리의 주인공은 “빨갱이라는 점을 간첩이라는 점에 잇대던”(117쪽) 멸공 시대의 공작원이다. 국정원이 아직 안기부이던 시절 첩보 전쟁이 시들해지며 은퇴한 그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무언가 깜박깜박”(87쪽)하고, “서서 오줌을 누지 못하게 된 뒤로 단짝이 된 자괴감”(87쪽)을 맞이하는 노인이 되었다. 이 노인은 어느 날 신문 부고란을 통해 받은 암호로 과거의 영광을 찾아 나선다. 여기서부터 책은 위기에 처한 가족, 친구, 연인을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모험 소설의 문법을 충실히 따른다. 아버지와 아들, 국가와 공작원, 배반자와 동료, 유다와 사도 요한(바울), 젊음과 늙음, 성장과 노화, 왕자와 고아, 신화와 일상, 아군과 적군, 북한과 남한, 대립 관계 이편과 저편의 축. 오르락내리락하는 아득한 관계의 저울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첩보와 모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연결하고 추동하는 것은 인물들 각자의 ‘직업’,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다. 주인공 김‘감독’은 사물의 혼을 읽는 능력과 인간 사진기 수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아들이자, 자신의 빛나는 재능을 알아보고 거둬 준 이를 존경하는 부하이며, 아내의 이름조차 망각한 칠순 언저리의 노인이기도 하다. 김감독의 두 가지 능력 중 하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감독은 그 스스로 직업을 선택했다기보다 직업으로부터 선택되었다고 말해야 옳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상사이며 한때 국내외 첩보망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그분’, 김실장이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굴해 채용한 것이다. 모험 중에 그와 같은 경로로 선택된 이들이 두 명 더 등장한다. 누구든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원하는 바를 건져 내는 피셔맨 김‘배우’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진실을 직조하는 재단사 김‘작가’.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도 서로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어 누워 있을 때조차 전직 작가가 아닌 그냥 작가로 불리는 것처럼, 어떤 보통명사는 세월과 함께 고유명사가 되기도”(91쪽) 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김감독, 김배우, 김작가라는 가면 뒤의 존재들이다.

그들의 진짜 이름만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은 아니다. 이 셋 중 누군가는 김일성이 죽고 정권이 교체되며 해외영업부가 와해되던 마지막 순간에 목사와 그의 열두 제자만이 알던 안가의 위치를 발설해 목사를 배신했다는 무시무시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또한 김감독은 여정을 지속하며 자신의 기억 군데군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첩보 소설 주인공으로서 김감독의 목표는 배신자를 찾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모험 소설 주인공으로서 김감독의 목표는 비어 있는 기억을 채워 온전한 자신으로 모험의 끝에 도달하는 것이 된다. 서로 다른 듯 보이는 두 목표는 ‘김실장을 찾는다’는 공동의 지향점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결말로 수렴된다.
진실을 어떻게 밝힌단 말인가? 역정보를 섞어 혼란을 가져오는 소설 도입부의 기만 전술은 독자로 하여금 이 늙은 특수 요원 주인공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김감독은 스스로도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독자들은 그의 서술 중 무엇이 회고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종잡을 수 없다. 그런 그가 “보물이 묻힌 곳을 정확히 가리키는 보물 지도”(90쪽)이기 때문에 모험의 끝, 보물섬을 향하는 항로는 정확하지 않아 비뚤고 위태롭다. 이때 과거의 한 구절이 김감독에게 일러 준다. 비언어적 생체 신호를 추적하라고.
“빈틈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스트레스는 어떤 형태든 비언어적 생체 신호를 남긴다네. … 인간의 몸뚱이는 혀투성이니까. 나라면 취조가 시작되자마자 허를 찌르듯 적당한 진실을 던져주겠어. 진실이야말로 활용하기에 따라 가장 교묘한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진실들 사이에 거짓 하나를 끼워넣는 거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햄처럼. 이것은 빵인가, 햄인가? 샌드위치지. 정확히는 햄 샌드위치. 빵은 어디로 갔나? 진실은 인식의 맹점 속으로 빨려들어가버리는 거야.”(185쪽)
“머릿속이 식은 촛농처럼 뿌옇게 굳어버린 느낌”(87쪽)으로 곧장 잠식 당하는 이와 우리는 동행해야 한다. 소설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지만 김감독이 혼을 읽을 수 없었던 하모니카에 얽힌 이야기가 밝혀지는 순간은 세 명의 선원이 드디어 김실장이라는 보물이 묻힌 보물섬에,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과 일치한다. “당신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말해보라. 그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87쪽)는 스스로의 독백처럼, 김감독은 하모니카의 주인 김도식으로서, ‘라이카’이자 ‘김감독’의 탄생과 김실장 간의 상관관계를 깨닫는다.
『나라가 당신 것이니』가 지목하는 ‘나라’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하”(131쪽)여 진실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이며, “조각낸 사실들 사이사이 교묘하게 끼워 넣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시기심과 박탈감을 건드려 삶 전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124쪽) 올가미를 치는 사냥꾼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 경구를 발화하는 자다. ‘나라’가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에게 ‘나라’를 주는 사람. 그것은 가려진 진실 아래 맹목적으로 ‘당신’을 따르던 김감독, ‘나’다. 그리고 소설 밖의 나, 바로 당신이다. 첩보 요원인 김감독의 이야기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경유해 모험의 성격을 띠는 것은 그래서가 아닐까. 진실의 열쇠가 놓인 모험의 끝으로 당신을 함께 안내하기 위함인 것이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