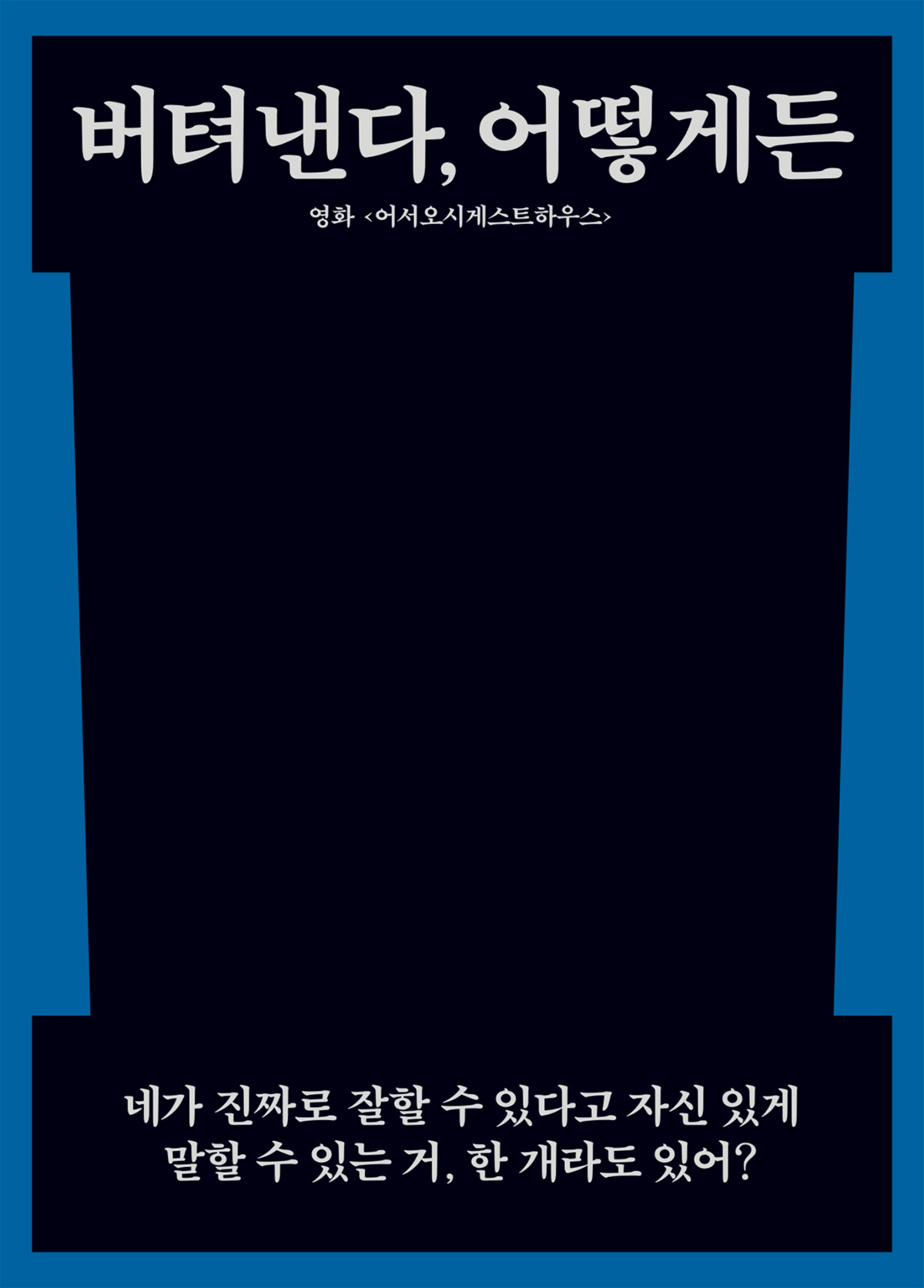
신조어의 파랑(波浪)으로 넘실거리는 시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신조어 탄생의 이면에는 먹고살기 바빠 팍팍해진 청년층의 현실 비판이 담겨있다. 학교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흥청망청 소비하여 해소하는 데 든 돈을 ‘시발비용’이라 일컫고, 예매해둔 티켓을 까먹는다든가 어딘가에 헛걸음하거나 하여 쓸데없이 지출한 금액을 ‘멍청비용’이라 부르는 등 어떻게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잔뜩 부정적으로 지어진 신조어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대한의 가성비로 행복을 누리고자 일상 속에서 기쁜 일들을 찾아내려는 행위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부르고,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한국인들의 현실을 꼬집으며 ‘워라밸(Work와 Life의 Balance)’의 중요성을 주창한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헬조선을 벗어나야 한다느니 하는 지독히도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현실 분석의 세태를 벗어나 욜로를 외치며 소심한 일탈을 시도하는 현실 도피의 단계로 접어든 듯하다. 어떻게든 행복한 일을 짜내어가며 살아남고, 훗날의 여행을 위해 버텨내는 청년들의 삶은 출판업계에도 적극 반영되었다. 요즘 대형 서점의 인기 서적 코너에서는 힐링 에세이가 대세다. ‹곰돌이 푸우, 행복한 일은 항상 있어›의 대성공 이후 표지만 갈아 끼우며 모든 서가를 장악한 힐링 에세이 시리즈는 이미 웹상에서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드라이한 생활의 반복에 지독히도 찌들어버린 청년들의 심장까지 피상적인 위로가 닿는 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심요한 감독의 ‹어서오시게스트 하우스›는 여타 청년 힐링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작품이다. 관객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도 않고, 우리의 넋두리를 언제까지고 경청해주지도 않는다. 다만 부딪쳐서 배워보라며 겨울날의 파도로 내몰 뿐이다. 몸에 딱 달라붙는 스윔수트를 입고, 얄팍한 서핑보트 하나에 오롯이 기대어 버텨내도록. 부모도 아닌 학과장 교수에게까지 ‘제발 좀 졸업해서 취업을 하라’는 잔소리에 시달리는 우리의 주인공 준근은 그다지 멋진 사람은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일자리는 구했지만 도피성으로 택한 즉흥적 결과에 불과하고, 그래서 영화 막바지까지 뭐 이뤄낸 것이 있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몸만 크지 속은 철부지인 청년으로 시작해서 껍데기만 구릿빛 피부가 되었을 뿐. 아! 그리고 서핑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 하나. 하지만 그 자체로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어리숙하고 가진 것도 없는 청년이 등장하는 성장 영화에서 꼭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내야만 하는가? 어쩌면 그러한 클리셰적인 목표 의식을 강요하는 것도 현대 사회의 병폐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준근이 100분여의 러닝타임 동안 이룩한 것은 서핑보트에서 일어난 일 밖에는 없지만, 정신없이 몰아치는 쇠화살 같은 겨울파도에 맞서 두발로 버텨 일어선 것 만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작품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진솔하게 해석해보자. 미시적으로는 거친 너울 속에서도 당당히 일어섰으니, 취업난과 학벌 경쟁 속에서도 구릿빛 피부와 함께 어떻게든 버텨내는 준근의 미래 속 실낱같은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연출적으로 뭉툭한 부분은 존재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야기 전개를 지나치게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게스트하우스의 감초 3인방이어디선가많이본인물설정같다는점. 그리고 살아있는 여성 캐릭터가 부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2019년 작(作)이라고 보기에는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대사와 행동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철저히 주인공 준근의 반동 인물로서만 작용한다. 영화의 완성도는 차치하더라도 벡델 테스트1는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작품에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입과 위로라는 키워드다. 앞서 말했듯 이 영화는 낯간지럽게 먼저 나서서 등을 다독여주는 타입은 아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매서운 겨울 바다의 파도 속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준근의 발버둥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티격태격 다투는 일동들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한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바다의 풍경에서 관객들 스스로가 찾은 위로를 얻는다. 고학번인데 아직도 학교를 못 벗어난 선배의 느낌을 소름 끼치도록 잘 살려낸 준근의 인물 설정도 한몫한다. 찌질하고 빈털터리에 자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성격 하나는 정말 생생하게 느껴진다. 준근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캐릭터이기에 오히려 다른 이들이 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멋지지 않은 준근에 이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은 억지스러운 서핑 대결의 결과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의 청년 관객들은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시간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영화를 감상하지 않는다. 영화라는 예술은 현실이나 동시대적 이슈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갑갑한 현실과 그로부터의도피-혹은거시적극복-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하고, 그러한 영화들은 그들에게 과하지 않은 위로와 콩알만 한 희망을 제시하며 젊고 염세적인 이 시대의 관객들의 요구를 사로잡으려 한다. 이미2019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위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마음을 설득했던 이 청년 감독이 선보일 차기작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내는’ 청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던지며 글을 마친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