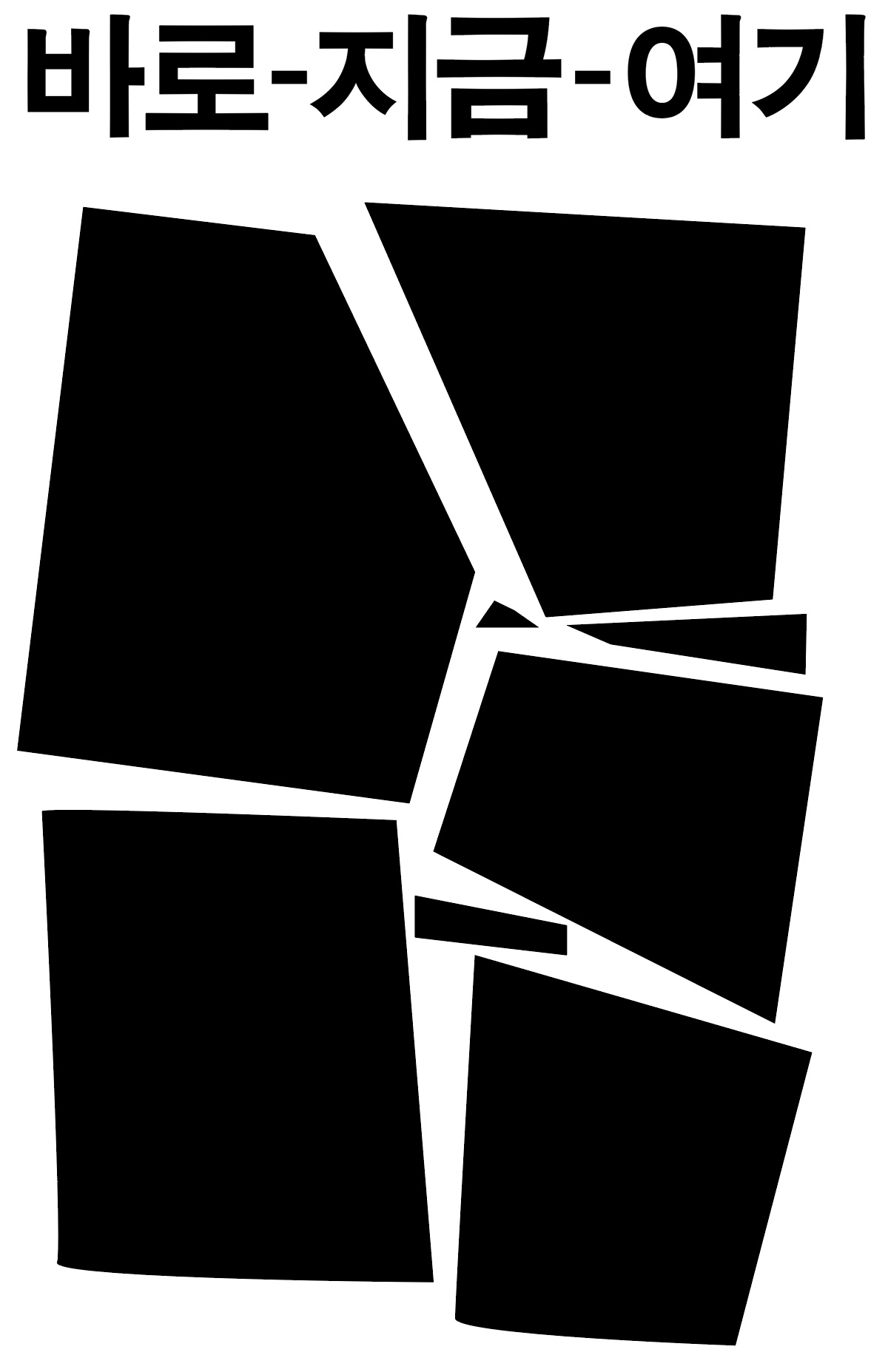
바야흐로, ‘움직임’의 시대가 도래했다.
Cinema vs Film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Cinema와 Film이 그것이다. 언뜻 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일전에 들었던 수업에서의 교수님 말씀을 잠시 빌리자면, “Film이 한 편의 영화만을 지칭한다면 Cinema는 영화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총체”1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영화를 Film이라 한다면 Cinema는 기술적인 영화 그 너머의 제도와 문화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은 ‘생산자로서의 작가’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물론 이 개념은 예술과 정치의 문제를 통해 보다 예민하고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생산자로서의 작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란 어느 천재의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작가는 그가 아무리 천재적이며 독창적이라 해도 세계라는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다. 부모를 잃은 고아라 할지라도 그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듯이, 작가의 독창성 역시 어떤 식으로든 세계를 통해 태어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때는 그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 세계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판타지라면 어떨까? 그러나 그 역시 작가가 숨쉬고 있는 바로–지금–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에 빚지지 않은 예술 작품은 없다. 작가가 만든 것은 그저 Film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Cinema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더듬어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배웠던 외재적 비평과 내재적 비평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작품 내부의 문법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내재적 비평이라 한다면, 작품을 둘러싼 환경이나 작가의 삶 등을 끌어와 작품을 비평하는 것을 외재적 비평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의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작가와 작품을 함께 바라볼 것인가, 따로 바라볼 것인가? 오랫동안 예술작품은 공산품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자신만의 독자성을 주장해왔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손끝에서 탄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가와 예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려 한다. 예술가를 사회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를, 더 나아가 사회 구조를 이야기해야 할 테니까.
어느 왕국
예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만들 때, 그 집단은 놀랍도록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래서일까? 때때로 예술계에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곤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METOO_WITHYOU(이하 미투 운동) 운동에 대해 떠올려 보자. 가해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왕국을 거느린 왕들이었다. 이들의 권력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는 왕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과연 함부로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이 왕국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이 물음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왜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진 권력 앞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처럼 소거되어버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왕국에서 버텨내야 했다.
앞서 예술가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예술가와 그의 작품 역시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예술계 역시 또 하나의 사회라는 점에서, 어느 왕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지닌 문제는 피해자들이 입은 일차적인 피해에만 있지 않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소거시켜 버리고 피해자들의 발언권을 빼앗아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려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한 천재적인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핑계 삼아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더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지금–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는 서로를 할퀴고 상처 내기도 했고 때로는 보듬어 안으며 연대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이것이 예술의 민낯이라면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잔인한 현실을 마주함으로 인해 얻은 것도 있다. 예술이 조금 더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의 예술이 과거를 탐닉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바로–지금–여기, 우리의 예술이 빚지고 있는 이 자리에 아직도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있다. 아직은 너무도 작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 진실을 말하려는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이제, 시작이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