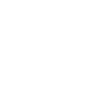글. 조효원
문학평론가
<문학과 사회> 편집동인
No.
모든 작품은 유제가 확정될 때까지 무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그렇듯이 유제 판결은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확정될 수 없다.
T.
두 세기 전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이렇게 적었다.
가까이 계시고
알아채기 어려운 하느님
허나 구원자도 자라네
위험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은 그러나 신이 아니라 위험이다. 알아채기도 전혀 어렵지 않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위험 많은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은 심지어 구원자조차 기껏해야 웃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극히 하찮은 위험 앞에서 무람없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이미 떠나버린 신을 구태여 배격하고 있을 때, 실로 커다란 위험의 한복판에서 다만 속으로만 삼켜지는 기도는 아직 오지 않은 신을 애써 배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신이건 혹은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건, 또 우리를 떠나든 버리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혀 궁핍하지 않다. 설령 실제로는 궁핍하다 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궁핍이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토록 많은 위험 덕분에.
I.
신은 세계 밖 저편에서 여전히 영원히 감감무소식이고, 신 대신에 도래한 위험이 일상의 풍경, 보편적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신을 잃고 위험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점점 더 급격하고 과격하게 세계를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위험으로 감지하거나 위험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잃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세계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를 읽을 수 없는 까닭은 한편으로 세계 텍스트 자체의 자간과 행간이 너무 빡빡한 나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글자들이 서로 겹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글자들의 겹쳐짐은 실상 글자들의 으깨짐과 다를 바 없다.)
다른 한편으로 - 이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읽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창조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계의 독서 불가능성은 점점 더 여실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상실의 과정이 금세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완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단 세계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안팎으로 간단없이 내팽개쳐지는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이유도 모른 채 세계를 획득하고, 끝을 모르는 채 세계를 상실한다. 다만 우리가 얻은 것과 잃는 것이 정말로 세계인지, 그것을 끝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다. 그러나 세계 상실이(우리 삶의) 태초부터 진행되어 왔고 (우리 삶의) 끝까지 완료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해도, 오늘에 와서 세계 상실의 속도와 정도가 특히 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덜 도드라지는, 그러나 가장 문제적인 사례를 우리는 땅의 작품과 작품의 땅이 모조리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를 살도록 내몰고 있는 이 세계의 땅은 더 이상 가능성을 배태하는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죽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죽음을 모르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그 자체로 고유한 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껏 땅이 품어온 죽음들이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구성한 힘 - 우리는 통상 이것을 ‘역사’라고 부르는데 - 이었다면 죽음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거의 예외없이 세계 텍스트를 해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윤서, Matryoshka, 캔버스에 유채, 27.3x22.0cm, 2016
이윤서, Matryoshka, 캔버스에 유채, 27.3x22.0cm, 2016
T.
접혀서 해체된 세계 텍스트의 한 모습.
도화지 왼쪽에 에덴동산을 짜서 문지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짜서 문지르고 하와와 뱀도 짜서 문지른다. 반으로 접어 꾹꾹 눌러 준다. 도화지 오른쪽에 갈보리 언덕이 찍힌다. 나무 십자가가 찍히고 구원받을 강도와 구원받지 못할 강도도 찍힌다. […] 접힌 도화지 속에서 예수는 열매를 흘리고 있다. 구원받을 강도와 하와는 그 열매를 주워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나무 십자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내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다. 뱀은 구원받지 못할 강도만 친친 감아 땅속으로 기어들어 가 죽음보다 더 아픈 잠을 잔다.
- 여정, <데칼코마니II逆역데칼코마니> 부분, <<몇 명의 내가 있는 액자 하나>>
그런데 땅은 어떤 이유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까? 태초와 구원을 겹쳐 문지를 줄 알았던 시인의 지혜를 빌리자면, 그것은 에덴동산과 갈보리 언덕이 접힌 도화지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까닭이다. 바꿔 말해, 원죄의 관념이 완전히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존재 일반을 죄로 얼룩진 피조물로 바라보는 관점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기술적으로 말끔히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관으로 대체되었다. 한때 무서운 위엄으로 인간의 삶을 가혹하게 짓누르던 원죄 개념이 이제는 한갓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망상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소된 원죄 개념으로 인해 이제 죽음이 위엄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죄가 없다면 구원(자)의 필요성 역시 사라지며,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 어떤 존엄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며, 존엄의 가치가 사라지면 죽음은 그저 하찮은 물리적 변화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죄가 없다면 내세를 여는 하늘과 죽음을 거두는 땅의 위력은 필연적으로 쇠잔해지게 마련이며, 그렇게 쪼그라든 하늘 아래 위축된 땅 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중에서 가장 참담한 일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다명명에 의한 이름의 살해이다. 끊임없이 살해되는 이름들 중에서 가장 무참한 경우는 물론 인간의 이름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작품의 이름이다. 아직 (원)죄와 구원이 서로 대칭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역사가 여전히 창조의 하늘과 종말의 땅 사이에서 펼쳐지는 두루마리였을 때, 그때 태어난 작품들은 이름과 더불어 창조될 수 있었으며 그 위대함의 크기에 따라 작품의 이름 역시 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죄의 개념과 구원의 이념이 공히 익명의 기술에 의해 심하게 구겨져 버린 지금, 가까스로 탄생하는 모든 작품들은 오직 상표의 비호 아래서만 어렵사리 이름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이름을 얻은 뛰어난 작품이라 해도 제 이름을 위대함의 차원으로 드높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높이를 전제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높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해서 오늘날 모든 작품명은, 약간의 과장을 감수하고 비유해 본다면, 마치 간판이 붙고 떨어지듯이, 입간판이 세워지고 쓰러지듯이, 전단이 뿌려지고 버려지듯이, 짧고 가볍고 가냘픈 목숨만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L.
죄를 몰라서 궁핍이 궁핍하게 된 시대의 시인은 이렇게 적는다.
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나는 죄 / 죄의 본질 / 사람 새끼
발 아래로 눈먼 새들이 떨어졌다
(하늘 끝에는 무덤만이 득실거려)
- 김사람, <(고양이)방울> 부분, <<나는 이미 한 생을 잘못 살았다>>
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으므로, 죄를 모르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으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이 우리를 내치는 방식은 - 이것은 일견 놀랍지만 두 번 생각하면 너무나 익숙한 현상인데 - 무한히 다양하고 한없이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너무 친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아름다움의 이념, 즉 죄의 원역사를 망각하고 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죄가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더없이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다. 죄의 기억이 사라지고 오직 아름다운 것들만이 충만한 세상에서는 죽음이 땅과 갈라서고 이름들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일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땅 위에서는 간판이 떨어지면 즉시 새 간판이 붙을 것이고, 떨어진 전단 위로는 곧장 따끈따끈한 새 전단들이 눈먼 새처럼 푸드득거릴 것이다. 또한 이 세계에서는 하늘 끝에 득실거리는 것이 무덤이든 작품이든 그 누구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E.
모든 제목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제목도 정당한 제목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창작 행위가 그렇듯이 유제를 고집하는 행위는 작품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