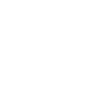사적(私的)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촬영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된 순간을 확인한 순간 이 상황을 찍어야겠다고, 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다큐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큐멘터리 <소꿉놀이>는 그러한 결심이 실현될 때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독립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는 2012년 EDIF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단편으로 지원받아 시작돼 2015년 제15회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됐다.
글. 선나리
<소꿉놀이>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든 이야기는 두 줄이 찍힌 임신 테스트기에서 시작된다. ‘인생을 화려하게 즐기던 철딱서니 없는 23살의 대학생 수빈’은 그렇게 갑자기 엄마가 되었다. 김수빈은 “누구든 갑자기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서도 “독립 다큐멘터리가 주는 무거운 느낌을 최대한 덜어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가벼울 수 없는 주제를 다뤘음에도 <소꿉놀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다큐멘터리는 러닝타임 내내 유머와 웃음이 흐른다.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은 연출된 장면인가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임신테스트기 장면은 세 번째로 테스트한 시점이에요. 그전까지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현실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었죠. 그 상황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1인칭으로 삶을 사는 시선이 있다고 할 때 예술가 김수빈이라고 표현하든 분열된 자아라고 표현하든 ‘이 일이 네 인생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찍어보고 싶지 않니?’라는 마음의 소리에 움직였죠.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포착할지 방송영상과의 본능적인 촉을 항상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과 무관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육아와 학업, 일을 병행하면서 촬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념思念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대와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일에 화를 내게 만들거든요. 또 창작이라는 건 실천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창작을 하려면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야기만 많이 해봤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꾸준히 하다가 상황이 안 되면 확 놨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한 건데, 사실 저도 제가 이걸 끝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카메라가 나를 향하면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잖아요? 내가 왠지 다른 사람 같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촬영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작 행위였어요. 육아의 시간 동안 이거라도 찍으면 적어도 삶에 대한 기록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죠. 나중에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동안 애 키우고 학교 다니는 것 말고도 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 삶에서 건져낸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죠.
저에게 촬영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부정적으로는 뭐 하나 현실 같지가 않고 모든 게 착란錯亂 같아진다는 것이죠. 맨날 졸린 와중에 복잡한 심리상태가 계속 이어졌지만 좀 더 나중에, 몇 년치 찍은 걸 편집하면서야 저를 희화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임신 이후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통해 수행 중인 여러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큐멘터리 감독의 역할까지 포함해서요.(웃음)
감독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제가 엄마라는 것이 낯설어요. 지금도 적응이 안 되고 붕 뜬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변한 점이 있다면 제가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예술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다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게 일상에 부딪히는 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도 살아야 하고 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로 존재해야 하니까요. 눈앞에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됐죠. 그래서 더 필사적이 된다고 할까요?
<소꿉놀이>를 보면 ‘솔직하다’는 단어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처음에 들은 이야기는 “네 영화 속에 네가 없다”였어요. ‘왜 날 얼마나 더 드러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서야 그 자만을 좀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김수빈이란 캐릭터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 이 장면은 넣기 싫었지? 알아. 근데 이거 필요해’. 그래서 그 장면을 넣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있고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 혹은 타인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시선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건 안 넣어도 되겠지?’ 싶은 걸 분명히 드러내야 해요. 관객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뻔하면서도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사적 다큐멘터리는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고 자신한테 정말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사적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해 또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사적 다큐멘터리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처럼 통속적으로 만들면 관객의 반응은 ‘네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겠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면서 대중 혹은 관객에게 캐릭터가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야 했고, 여러 등장인물 각자의 입장을 더 포섭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했어요. 촬영 때는 사람들이 대화 도중에 언제 마음을 여는지, 어떻게 카메라를 들어야 신경을 안 쓰고 눈치 보지 않는지 봐야 해요. 자연스럽게 난입해서 얼레벌레 찍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테크닉이라 생각해요. 전 나중에는 겨드랑이에 끼고 찍으니까 물 흐르듯이 묻어나게 찍히더라고요.
<소꿉놀이>에서 시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라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아프면서 그 사람을 한 명의 여성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갱년기로 아프게 되고 자랑스러운 뮤지컬 배우였던 아들은 스시를 배우겠다며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 와중에 맨날 저와 신랑이 싸우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어쩔 수 없이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곳에 눌러앉게 된 거잖아요. 당시에는 괴롭다가도 ‘어머니도 그냥 사람이구나’, ‘누구나 당연시하는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여자의 입장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내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힘들 거고 어차피 잠 못 잘 거고 어차피 생사의 갈림길을 왔다 갔다 할 상황이잖아요. 그 감성을 활용해 창작을 하든 심경에 대한 기록을 치열하게 남기든지 간에요.
오늘도 카메라는 돌아가고 나는 웃고 떠든다. 분명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맞는데 감독이 누군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다음 씬을 예측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이것은 한 개의 샷, 한 테이크로 죽을 때까지 찍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야 너는 돌아라, 나는 뛸 테니까. 나는 매 순간 다양한 역할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영화가 끝나고 극장 불이
켜질 때 나 김수빈은 김수빈으로 남을 것이다.
<소꿉놀이> 중
김수빈 감독의 시어머니는 말한다. “인생은 다 소꿉놀이야.” 오늘도 노아 엄마, 하강웅 부인의 역할 외에 뮤지컬 통·번역가 및 조연출로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그녀에게 <소꿉놀이> 속 최고의 장면을 물었더니 편집 없이 하나의 상황으로 쭉 이어진 씬을 꼽았다. 그것이 최고의 장면인 이유는 한 개의 샷, 한 테이크로 죽을 때까지 찍는, 그런 최고의 영화를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