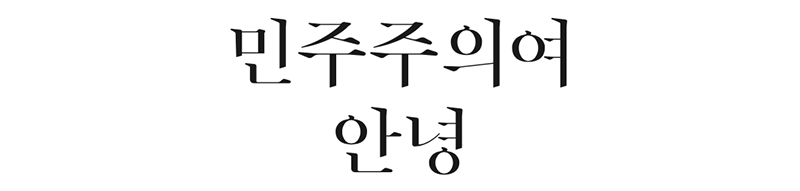
* 스포일러 있습니다
영화 <특별 시민>
나는 음모론자, 공포 분자, 흑색 선전, 백색 테러에 관한 영화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반공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정치적 폭력은 시각화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내 바람은 이뤄질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둔 어느 때 나는 <특별 시민>을 관람했다. 박인제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명료하고 단순한 형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순함 밑에 복잡한 영향 관계들을 숨기고 있었다.
싱크홀
나는 왜 <특별 시민>을 단순하다고 말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쇼트 구성은 미국 드라마의 한 시즌을 엮어놓은 것에 가깝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서 영화의 내러티브 경제는 어딘가 어그러진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재선에 성공하고 싶은 최민식이 어린 광고기획자 심은경을 선거본부의 홍보팀으로 영입하고, 심은경이 최민식의 신뢰를 얻고, 잘나가는 여기자 문소리가 심은경을 이용해 기사를 내고,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곽도원은 다른 계산을 한다. 그런 <특별시민>의 내러티브는 한 영화에 조화롭게 움트기에는 큰 규모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됐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영화적 형식에 이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 씬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대응시키는 구성을 취한다. 서울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기는 에피소드는 하나의 영화로 담아도 될 만한 소재이지만 재해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위선을 그려내는 작은 에피소드로 소비될 뿐이다. 여러 잔가지들을 쳐내고 상업 영화 본연의 목적인 재미에 집중했다면 내러티브가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구현됐을 것이다.

<특별 시민>
방백
영화 <특별 시민>은 미국 드라마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최민식이 조그마한 정육점에서 직접 소고기를 숯불에 구어 먹는 장면. 이 장면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장면을 번안한 듯하다. 자수성가한 남부 출신의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가 어렸을 적 즐겨 먹었던 폭립을 허름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만취한 최민식이 음주운전으로 18사단 이등병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죽음을 자신의 딸에게 뒤집어씌우는 장면에서는 프랭크 언더우드가 지닌 이중적인 면모가 떠오른다. 그러한 면모는 현대의 선거 정치가 갖고 있는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내러티브 장치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우리는 현대의 선거 정치가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의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미지 정치이며 자본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금권 정치라고 생각한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이러한 의심을 증폭하고 재현하는 데 알맞은 서사적 장치인 방백을 선보인다. 프랭크 언더우드는 종종 관객에게 자신의 본심을 설명하는 특권적인 위치에 자리하는데 이는 정치인의 공적 발언 뒤에 숨어있는 정치공학을 냉소적으로 뒤튼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특별시민>은 그러한 방백처럼 현대 민주주의를 구조화하는 전략을 위해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의 장면에 대치하는 식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이 같은 평면적인 내러티브 구성은 현대 민주주의를 상대하기에는 취약해 보인다.

<특별 시민>
출구 전략
대신에 <특별시민>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심, 회의, 적개심을 이용하는 편을 선택한다. 이 순간 <조폭마누라>와 같은 2000년대 한국 조폭 코미디 영화와 <웰컴 투 동막골> 같은 6·25 판타지 영화의 기묘한 결합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의를 경유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의 세계를 조폭의 형님, 아우 세계로 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자체를 협잡으로 보는 모양새를 취한다. 2010년대에 등장하는 이른바 정치 영화의 대부분이 협잡과 정치를 일치시키는 관점을 선택하는 건 조폭 코미디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더불어 6·25 판타지 영화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극화함으로써 민족주의라는 합의된 대중의 상상적 영역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는 방식은 <특별시민> 출구 전략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특별시민>은 이 두 영화적 형식이 낳은 결과이고 또 이들의 미래이다.
엘리트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을 기만하고, 의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합집산으로 정세를 반전시키고, 검찰은 정치공학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대중들은 이들에 의해 철저하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2010년대의 대중문화를 잠식하고 있다. 정치가 협잡이라는 전제를 공유하는 영화들 가운데, 제도 정치와 사회적 정의의 갈등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80년대라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치 영화 태반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특별시민>은 형식적으로 아쉬운 영화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불가피하게 대중문화의 합의된 상상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조폭 코미디와 6·25 판타지 영화, 그리고 미국 드라마와의 결합이 정치에 관한 냉소주의로 향한다는 점은 자못 흥미로워 보인다. <특별시민>의 전략이 남긴 그림자에는 앞에서 거론한 영화적 형식들의 한계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고 보수 정권 10년도 끝난 지금 우리는 어떤 정치 영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